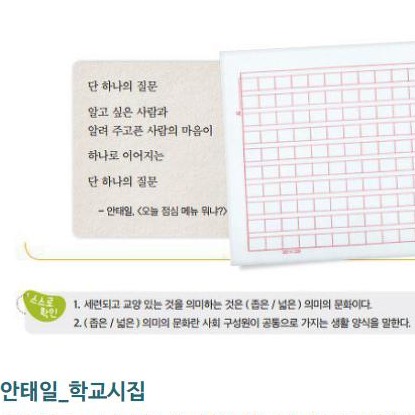자라의 형상에 경악한 심장은, 솥뚜껑의 검은 그림자만 마주해도 용봉탕 조리법을 검색하는 과민반응을 보인다.
조회를 마친 뒤 교실 문을 나설 때, 반 아이 하나가 내 눈동자의 흔들림을 살피며 조용히 문장을 건넸다.
아이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음성에는 타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옅은 망설임이 묻어났다.
"선생님, 저... 오늘 제출하려 했는데 지참하지 못했어요..."
"무엇을 안 가져왔니?"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여섯 글자를 내뱉었고, 나는 그 순간 여섯 발의 핵탄두가 내 인식의 지평선 위로 낙하하는 듯한 충격을 감지했다.
"출생신고서요."
출. 생. 신. 고. 서. 요.
그 여섯 음절이 발생시킨 방사능 낙진은 전두엽을 지나 좌심방과 우심실을 거쳐, 마침내 좌뇌의 논리와 우뇌의 직관을 동시에 마비시켰다.
다행히 담임 교사인 내 얼굴 근육은 1밀리의 미동도 보이지 않았다. 표정을 은폐한 의도가 아니라, 안면 근육의 제어권을 상실한 결과였다. 사고 회로가 일시적으로 단전되자 육체의 표정 또한 그 좌표에서 동결된 탓이다.
"아..."
"출생신고서 바로 가져오려 했는데 깜빡했어요."
"아하..."
잠시 말의 간격을 벌어둔 사이, 재빨리 대뇌피질에 연산 명령을 하달했다. 두뇌는 내가 짐작 가능한 모든 비극의 서사를 집요하게 집필하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아직 행정적 차원에서 출생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존재인가? 아니야, 그렇다면 초, 중, 고를 거치며 네이스라는 거대한 국가 행정망에 데이터로 포착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
혹시 이 아이가 벌써 부모라는 지위를 얻은 것일까? 아니야,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럴 게 아니라 출석 인정 결석에 관한 조항과 부칙을 샅샅이 탐독해야 한다. 이 아이에게 늦둥이 동생이 태어난 사건이 발생한 것일까? 아니야, 설령 그렇다 한들 왜 나에게 출생신고서라는 사적인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내가 아빠가 되었다는 통보일까? 아니야, 우리 아이 출생신고서를 왜 이 아이가 가져온단 말인가. 두뇌는 피폭된 낙진의 후유증으로 더 이상의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지 못했다. 뇌는 이제 사유의 노동을 중단하겠노라고 내게 일방적인 파업을 통보해왔다.
멈춰버린 머리를 대신해 이번에는 구강의 근육을 가동해 보기로 결정했다.
"그... 어... 출생신고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나는 이 아이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의 범주로 끌어안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성으로 납득이 불가하다면 가슴으로라도 받아들이고 싶었다. 침을 꿀꺽 삼키며 아이의 입술에서 발화될 진실을 기다렸다.
"아! 아! 아!"
아이는 망각했던 기억이 떠올랐다는 듯 손뼉을 치며 무구한 표정으로 웃었다. 아이가 웃으니 나 또한 일단 미소의 가면을 급조했다. 억지웃음을 만드는 일은 눈을 ㅅ자로 만드는 것보다 입 주변 근육과 광대뼈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껏 견인하는 작업이 훨씬 수월했다.
하지만 내 서툰 웃음은 마스크라는 부직포 장벽에 가로막혀 아이의 망막에 닿지 못했다. 그럼에도 나는 태연함을 가장한 채 다시 물었다.
"무엇을... 안 가져왔다고 했지?"
"아, 출'결' 신고서요. 출결 신고서. 저번 주에 조퇴하며 발생한 서류요."
억지로 끌어올렸던 마스크 속 하관이 허무하게 툭 떨어졌다. 안도감이 담긴 얇은 호흡이 마스크의 틈새로 슬그머니 탈출했다.
"아... 출'결' 신고서를 안 가져왔구나. 출생이 아니라, 출결. 내일 가져오렴."
아이를 교실로 들여보내고, 나는 교무실 의자의 중력에 온몸을 위탁했다. 자라에 놀란 가슴은, 솥뚜껑이라는 환영만 마주하고도 용봉탕 조리법을 검색하는 희극을 연출한 셈이다. 직접 겪은 일과 건너 들은 수많은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담고 살다 보니,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내 마음은 이미 온 세상을 다 헤매고 돌아왔다.
동사무소와 교장실, 상담실과 법원, 그리고 청소년 쉼터와 보건복지부, 경찰서, 병원, 교육청까지. 이보다 더 거창한 착각의 서사는 존재하지 않을 터이다. 오늘도 아무런 비극 없이 무탈하게 하루가 소멸했다는 현실에 두 손을 모아 가만히 감사를 올렸다.
'자라'와 같은 일들은 더 이상 마주하지 않게 되기를.
내일도 오늘만큼만 무사하기를.
올해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저 무사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