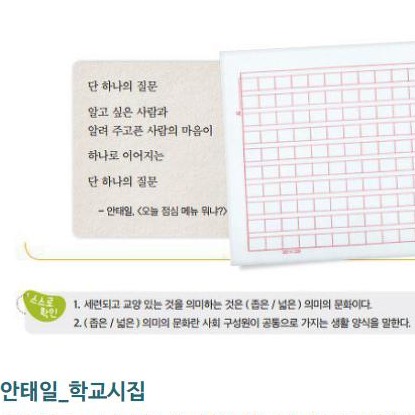<율촌 칡냉면> 원작 ‘짜장면’ 정진권 작
칡냉면은 홍대 앞 율촌 냉면에서 먹어야 맛이 난다.
그 면은 칡 색 색소가 퍽퍽 들어가 있어야 하고, 될 수 있는대로 다데기는 사정없이 넣어야 하고, 육수에는 조미료 맛이 촘촘히 박혀 있어야 한다. 사리는 반드시 추가해야 하고, 위장이 허락한다면 식탁 위에 고기 만두도 올려 놓아야 한다.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으니 대형 선풍기 옆에 쩍 하고 달라 붙어 앉아야 마음이 편하다.
비냉 그릇은 육수를 사정없이 부어 먹어야 하며, 무조건 육수 더주쇼 해야 더욱 운치가 있다. 그리고 먹고 난 후 이빨 가득 담긴 고춧가루는 누렇고 뾰족한 이빨 사이 사이에 억세게 박혀 있어야 한다. 식초병이나 겨자 병은 저리 치워 놓아야 가벼운 마음으로 면에 손을 댈 수 있다. 이미 범벅이 된 조미료에 뭘 더 얹을까.
칡냉면 그릇으로 가증 흔한 것은 은색에 호동 얼굴만한 스뎅인데 사장님이 투자만 한다면 얼음 그릇도 좋다. 물론 위생은 책임질 수 없다.
그리고 홍대 앞 냉면 집 골목은 참 좋다. 지나가는 남정네 여정네들 ‘인심’ 좋은 얼굴을 보면, 깨끗지 못한 내 몰골은 여름 날 털신같아서 이거 여러 의미로 좋다. 나는 마치 때가 가득찬 어느 시대 어느 골목 거지마냥 보이겠지만 어떻든 그 길 지나 율촌 냉면 먹고 주인에게 돈을 치르고 다시 그 골목 지나고 오면 마음이 편하다.
내가 어려서 최초로 대면한 칡냉면이 홍대 율촌 냉면이고 내가 맨 처음 내 돈내고 가본 냉면집이 그 집이고, 차례로 문을 닫은 신촌 율촌, 이대 율촌에도 끝까지 남은 것도 홍대 그 집이다. 나는 냉면이라면 다 조미료 칡냉면을 생각했고 평양이나 함흥이나 옥천은 다 냉면아님, 그런 줄로만 알고 컸다.
그 동안 서울 시골 할 것 없이 음식점이 많이도 불어났다. 베트남식, 일식, 터키식, 인도식, 또 무슨 식이 더 있는지 모른다. 냉면 집도 그러한데, 유명하고 비싸다는 곳은 잘 모르지만 보통이라는 냉면집은 더러 가 보았다. 그러나 요런 냉면집 먹을 때는 불안하고 결국에는 혓빗대가 휘어서 그 전통이라는 냉면집 분위기와 음식 맛을 한번도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래도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곳은 홍대 율촌 냉면 한 곳일 수밖에 없고, 그 싼 듯한 조미료 맛 칡냉 중에서는 요 집이 또 킹왕짱일테다.
그러나 내 친애하던 율촌 냉면 체인점들은 자꾸 가게를 내 주고 새 사업을 하려는 모양이다. 웰빙 바람 불어 그런가 나보다 훌륭한 냉면 맛쟁이들 때문일까, 점점 줄어든다.
그러나 적어도 홍대 앞 율촌 냉면만은 오래 오래 남아 있었으면 한다.
그러면 나는 어 토요일 저녁 때 혹은 시험 감독 끝나고 호기있게 조미료 중독쟁이들을 인솔하고 홍대 앞 그 율촌 칡냉면 집으로 갈 것이다.
맛쟁이들도 그때만은 잠시 웰빙따위 잊고 흔쾌히 따라 나설 것이다. 가식 맛쟁이들은 그제서야 다데리를 이빨 사이 사이에 낑구며 깔깔대며 맛있게 먹을 것이고, 나는 허허 루저놈들 하면서 역시 맛있게 먹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모처럼 유능한 쿡방돌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나는 그의 손을 이끌고 홍대앞 율촌 냉면을 선뜻 갈 것이다. 이놈이 저항하면, “어허, 홍대 가면 여신들이 즐비하고 있다네” 하며 살랑 사랑 꼬실 것이다. 내 친구도 촌구석에 살아 눈 외롭게 사는 사람이니 냉면 보다 골목에 더 관심갈지 모르나, 나는 또 이렇게 안 외로이 칡냉면을 흡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