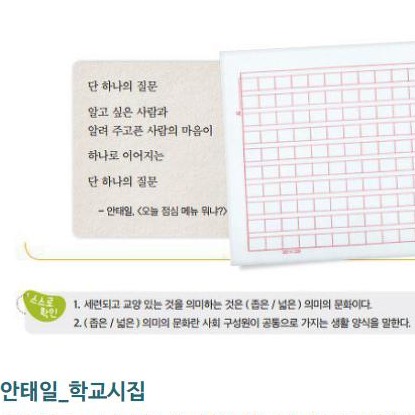불판 위에서 한우가 붉은 기운을 잃어가며 익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포유류의 조각난 사체가 아니라, 내 노동의 대가가 치환된 단백질 덩어리였다. 나는 그 고기를 바라보며 ‘보상’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저울질했다. 학생 생활지도 연구 학교인지 실험 학교인지 모를 그곳에서 소진된 내 에너지를 채우기에, 이 고기는 가장 완벽한 연료였다. 가난했던 초임 교사 시절, 한우는 내 지갑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성역이었다.
마침내 고기가 익었고, 불판 위에는 회색 꽃잎 같은 고기들이 나를 향해 유혹했다. 장유유서라는 유교 사회의 룰은 견고했다.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다는데, 하물며 뜨거운 한우 앞에서야 두말하면 입이 아팠다. 교육청 관계자들과 학생부장님이 먼저 젓가락을 들었고, 나는 내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부장님은 쿨하게 소주병을 땄다. 창밖에서는 거친 빗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이 만찬을 위한 완벽한 BGM처럼 깔렸다. 잘 익은 한우와 채워진 술잔, 그리고 적당한 습도까지 더해지니 ‘주마등’이라는 클리셰가 존재하는 이유를 납득했다. 젓가락을 들어 내 몫의 고기를 집으려던 찰나, 지난 시간의 고생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를 거쳐 간 이백여 명의 아이들, 교복에 밴 담배 냄새, 슬리퍼의 흙먼지, 출석부의 동그라미, 그리고 목젖의 떨림들 말이다. 그 모든 데이터가 빠르게 지나갔고, 이제 이 피로를 저 고기와 함께 위장으로 넘겨버릴 찰나였다.
행복했다. 적어도 학생부장님의 휴대폰이 울리기 전까지는 확실했다. 하지만 그 짧은 행복은 벨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아, 네. 네, 그러시군요. 으흠.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부장님이 나를 쳐다보았다. 선도 담당이자 초임 교사, 그게 바로 나였다. 그 순간 시선을 피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 타이밍을 놓쳤다. 그의 눈빛에서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를 읽어버린 나는 젓가락을 멈춘 채 표정을 관리했다. 부장님은 내 눈을 피했고, 교육청 관계자들은 내 눈치를 보느라 바빴다. 나는 식어가는 한우를 짧게 응시한 뒤 젓가락을 내려놓고, 새로 산 정장 재킷을 걸쳤다.
"안 샘, 우산은 있어?"
식당 주인에게 빌리면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머피의 법칙은 이럴 때만 오차 없이 작동한다. 주인은 남는 우산이 없다는 대답만 내놓았다.
식당 밖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우산 없이 빗속을 20분이나 걸어야 하는 징계 담당 교사라니, 이보다 더 처량한 신파극이 있을까 자문했다. 새로 산 정장은 빗물을 빠르게 빨아들이며 찢어질 듯 어깨를 짓눌렀다.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빗속을 걸어 우리 학교 바로 옆 중학교 학생부로 향했다.
그곳에는 빗물에 흠뻑 젖은 몰골로, 우리 학교 남학생 둘이 나만큼이나 초라하게 앉아 있었다. 옆 중학교 학생부장님이 사건의 개요를 브리핑해주었다. 중학교 앞에서 오토바이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교통사고인데, 왜 병원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고가 나자마자 녀석들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중학교 운동장으로 도망쳤다는 전언이었다. 피해자가 뺑소니라니, 참으로 기막힌 반전이었다.
"훔친 오토바이라네요?"
아하, 그제야 흩어진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창밖의 비는 이 부조리한 연극의 미장센을 완성하려는 듯 더욱 거세게 쏟아졌다. 중학교 학생부장님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녀석들을 데리고 나왔다. 다시 폭우 속으로, 우산도 없이, 무엇보다 한우 한 점 먹지 못한 채로 말이다.
새로 산 정장이 속절없이 젖어 들어갔다. 한우를 향해 열려 있던 나의 식도와 원초적인 허기마저 빗물에 잠기는 착각마저 들었다. 녀석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내 뒤를 따랐다. 이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이 게임이 공정하게 끝날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체벌이 당연하게 존재하던 시절이었다. 어디를 어떻게 공략해야 아이들이 ‘반성’이라는 결과를 도출할지 계산했다. 하지만 한우를 못 먹은 나의 욕정이 ‘분노’로 치환되어, ‘교육’이 아닌 ‘폭력’이 되는 사태만은 사절하고 싶었다.
나는 한우를 먹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웠다. 축축하게 젖어가는 정장과 식어가는 한우 사이에서, 내 이성은 위태로운 줄타기를 지속했다.
가벼운 접촉 사고였지만 몸은 다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만약 다친 부위에 물리적 충격을 가한다면, 그건 교육이 아니라 상해 치사나 다름없었다. 그것은 비효율적이고 리스크가 너무 큰 악수(惡手)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췄다. 녀석들도 덩달아 멈춰 서서 내 뒤통수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고개를 돌려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른 채 입을 열었다. 쏟아지는 폭우가 완벽한 방음벽이자 가림막이 되어주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내게는 데이터가 절실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타격 가능한 부위’에 대한 데이터였다. 다친 곳을 알아야 그곳을 피해서 ‘합리적인’ 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합리적인 교육자였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착각했다.
아이들은 멈칫하더니 대답을 망설였다. 교통사고가 난 사람에게 안 다친 곳이 어디냐고 묻는 질문만큼 어리석은 질문도 없었으리라. 그렇게 셋은 다시 말없이 10여 분을 걸어 빗속을 뚫고 학교 학생부에 도착했다. 확인서를 쓰게 하고 부모님께 연락을 취했다.
"일단 병원부터 가, 그리고 내일 다시 학생부로 와."
병원에서 ‘이상 없음’이라는 데이터가 확보되면, 그때가 진짜 2라운드의 서막이었다. 서류를 처리하는 사이, 한우집에서는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나의 첫 한우와 소주는 그렇게 폭우 속으로 증발해 버렸다.
그 남학생 둘은 몇 주 뒤, 이번엔 ‘흡연’이라는 다른 장르의 이슈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선도 대상만 80여 명이었고 담당 교사는 나 혼자였으니, 그들이 특별히 눈에 띌 리도, 그럴 여유도 없었다.
선도 1일 차, 밤은 깊었고 몸은 피곤했다. 반성문을 쓰던 ‘작가’들이 하나둘 탈고를 마치고 과학실을 나갔다. 그 두 녀석은 끝까지 남아서 원고를 붙잡고 있었다. 시계를 보며 간절히 집에 가고 싶었다. 당신들이 원고를 끝내야 내 퇴근이 보장된다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계산 때문이었다. 그냥 가라고 했더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20분 뒤, 녀석들은 반성문을 책상 위에 놓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도대체 무슨 대작을 썼길래 저러나 싶어 원고를 읽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기억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뒤 다시 원고를 읽었고, 헛웃음이 새어 나왔다.
"선생님은 이제껏 만난 선생님 중에서 가장 학생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선생님이라 느꼈습니다."
그럴 리가, 내가?
"그날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을 텐데 저희에게 화를 안 내시고 오히려 어디 다친 데 없냐고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동받았었습니다."
원고를 내려놓고 의자를 뒤로 젖혔다. 세상은 이토록 부조리한 연극이었던가. ‘합리적 처벌’을 위한 나의 냉정한 데이터 수집 질문이, 아이들에게는 ‘숭고한 사랑’으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커뮤니케이션이란, 결국 오해의 총합이라는 결과값이다. 교사의 말 한마디가 이런 방식으로도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그때 처음 깨달았다.
만약 그날 내가 화부터 냈다면 어땠을까. 테이블 위에 놓인 굵은 회초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쩌면 나의 ‘무서운 교사’라는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가, 이 낯선 ‘친절’의 진정성을 보증해 준 셈인지도 모른다. 원래부터 친근한 교사였다면, ‘역시 만만한 선생’이라며 나를 더 무시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나온 사건들, 그 조각난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말 한마디가 민원이 되기도 하고 추억이 되기도 하며 상처가 되기도 한다면, 이왕이면 ‘기분 좋게 혼내는’ 멘트를 연구하는 편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나는 그때 생각했다. 그것은 내 나름의 ‘생활지도 R&D’였던 셈이다.
체벌이 있었던, 2000년대 중반 그 때 그 시절의 학생부 징계 담당 교사의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