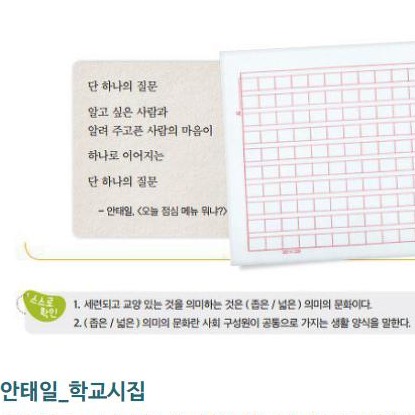<참교사 얼굴>
초임 시절 어느날 퇴근 후 집에갈 무렵, 교무실 선생님들은 퇴근 짐을 정리하며 모여 앉아 참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참교사의 모습은 나와는 여러 광년이나 떨어져 있을 이야기였지만 눈만 뜨면 이곳 저곳에서 그 이상적 모습에 대해 갈망하고 있었다.
대체 그 참교사란 무엇일까?
광활한 네트워크에 둘러싸인 SNS가 하나 있었다. 그 곳은 무한의 공간으로서 많은 선생들이 모여 있었다. 그 SNS에 글을 남기는 여러 교사들 중에는 가파른 산허리의 빽빽한 수풀에 둘러싸인 곳에 조그만한 분교에 교편을 잡고 사는 교사들도 있고,
또 온갖 문화 시설이 내리뻗은 역세권이나 평탄한 가정교육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들과 안락하게 사는 선생들도 있었으며, 또 한 곳에는 존재하는 모든 문제 행동을 조밀하게 터트려 주는 학교에 일하고 있는 선생들도 있었다.
또 SNS에서는 높은 이상을 꿈꾸는 교사로부터 흘러흐르는 시류에 맞추어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교사들도 있었다. 아무튼 이 SNS에는 교사들 수도 많았고 저마다 학교 살림살이 모양도 가지가지였으나, 그들에게 한가지 공통된 점은 모두가 그 참교사에 대한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그 설명하기 힘든 이상향에 대하여 유달리 감격하는 선생들도 없지 않았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는 참교사의 모습은 현장의 냉혹한 현실을 이겨내어 만든 이상향으로 쌓아올린 듯한 수많은 업적과 사랑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리고 그 업적들이 잘 어울리게 조화되어 학교 밖 사람들이 바라다 보아도 확실히 진정한 교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마치 죽은 시인의 사회라든가, 반항하지마라든가, 천사들의 합창에서나 나올 듯한 선생의 얼굴이라고 다들 믿었다.
넓은 아량으로 정신 멘탈은 사이언인 갓 정도의 멘탈력을 갖추고, 다양한 교육 활동에 쌓인 노하우, 만약에 참교사가 수업을 시작한다면, 천상의 교훈이 학생의 좌심바에서 우심실까지 울릴 것만 같았다.
담임 교사가 되면, 거만한 학생들의 악행은 없어지고, 무겁고 큰 현실의 무게들을 지체 없이 걷어내 줄 것만 같았다.
그런데 이 참교사의 기준이라는 것이 한걸음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저 망상처럼 헛개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 본래의 거룩한 이상적 모습이란 도대체 존재할까 의심도 든다.
하지만 이런 푸념이 희미해지면 학교 밖 사람들은 참교사 얼굴은 분명히 존재하고 어딘가에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타이틀을 차지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참교사를 만난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믿었다. 왜냐하면 참교사의 가르침은 숭고하고 웅장하면서도 사랑으로 다정스럽고 마치 그 열정 속에 온 인유를 포용하고도 남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수다를 나누다 언니샘이 말했다.
"전 참교사 샘이랑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도 매우 듣기 좋겠지요? 만약에 제가 그 참교사 샘이랑 만난다면 저는 정말 그 참교사 샘을 끔찍이 따를거에요."
그러자 이를 가만히 듣고 있던 부장교사가 말을 이었다.
"만약에 학교 밖 사람들의 예언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언제고 그 참교사 샘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언니샘은 손뼉을 치며 외쳤다.
"오프라인 연수에서라도 그런 참교사 샘을 만나 보았으면……."
부장교사는 애정이 많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어서 자기 부서 선생님의 큰 희망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언니샘에게
"샘은 아마 그런 참교사를 만날 것이다" 라고만 말하였다.
방학 무렵에 , SNS 일대에는 마침내 옛날부터 전해 오던 것과 같이 참교사 상을 갖춘 교사가 등장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여러 해 전에 한 젊은 교사가 학교 밖을 떠나 먼 교육연수원에 출강하여 멋진 연설을 하고 있다고 했다.
언니샘은 예언의 참교사가 드디어 나타났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몹시 설레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렇게
아니었다.
세월이 흘러갔다. 언니샘도 이제는 초임이 아니다. 그는 경력 교사가 되었다. 그는 SNS에서 교사들의 주의를 끄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일상 학교 교직 생활에는 유달리 뚜렷한 점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가 남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직도 하루의 수업을 마치고 빈 교실에서 그 참교사의 모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몇번의 연수와 모임을 다녀도 참교사의 얼굴이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나는 평생가도 참교사가 될 수 없을거야 하는 낙담을 뒤로하고 그저 늘 임하던 대로 열심히 하루 하루 배우고 또 가르쳤다.
언니샘은 그날도 배우고 느끼고 살아가고 상처받고 이겨내고 의지를 잊지 않고 그 마음 속에 있는 바를 학생들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수업은 그의 바램과 일치되어 있었으므로 의미가 있었고 자신의 가르침은 자신의 삶과 조화되어 있었으므로 바로 지금 이곳의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 교사가 하는 말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요, 삶의 부르짖음이었다. 그 속에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킨다는 윤택하고 순결한 교육 목표가 그의 귀중한 생명수 속에 녹아 들어간 것 같았다.
그의 이야기와 움직임에 귀와 마음을 기울이고 있던 한 학생은 언니샘의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알던 그 어떤 시보다도 더 고아한 시라고 느꼈다.
학생들은 진심 담긴 눈으로 그 존엄한 사람을 우러러 보았다. 그리고 그 온화하고 당정하고 사려 깊은 얼굴이야 말로 참교사라고 느꼈다. 학생은 참을 수 없는 충동으로 팔을 높이 들고 외쳤다.
"보시오 보시오. 선생님이야 말로 참교사의 얼굴과 똑같습니다"
"시끄러"
언니샘은 쿨하게 학생을 팔을 천천히 내려 주었다.
참교사란 그저 저마다의 이상적 모습을 갖춘 수만 수억개의 청사진일 뿐,
그저 한걸음 한걸음 성장하기만을 바라는 것이었다.
#학교_패러디문학관
(원작 '큰 바위 얼굴', 너새니얼 호손)
원작 제보 : Hwayong Ahn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