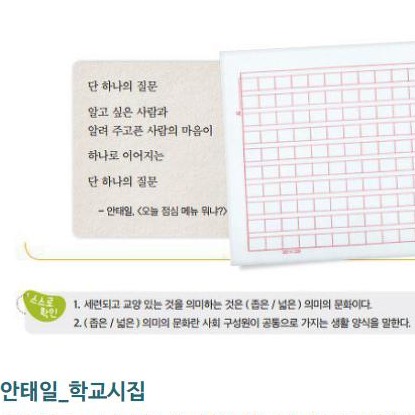교과부 기관지 꿈나래 21(교육마당 21)에서
1차 캔슬된, 초고 입니다.
-----------------
첫 발령받은 학교는 예비 교사시절 꿈꾸었던 것과 너무도 달랐었다. 접해 보지 못했던 낯선 아이들의 모습들. 공부에 손을 놓은 아이들, 집단 폭행, 경찰, 폭주족, 지역 주민의 잦은 민원, 복도에서 그리고 교실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 선생님을 향한 욕설, 수업 방해, 가출, 무단 조퇴, 왕따. ‘힘’으로 누르기를 몇 번.
그러나 결국은 다시 달라지지 않는 아이들. 숱한 좌절감 속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학교란 어떤 곳인지,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어떠해야하는지 의미를 잃어갔다.
그리고 새 학교, 새 학급을 맡게 되었다. 2010년. 새 아이들은, 이제껏 본적 없던 아이들이었다. 밝은 표정, 무언가 배우고 싶어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자, 는 것을 하고 하지 말자, 는 것을 하지 않는 아이들. 가르치는 맛, 보살펴 주는 맛을 알려준 아이들이었다. 행복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교직 생활이구나. 받을 줄 아는 아이들이기에,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었다.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 속에서 사랑을 배웠다. 그러나 그 행복은 교사의 역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님 덕인 것을 망각한 체 새 학년 새 학급을 맡게 되었다. 낯설었다.
성적 최하위반. 흡연, 가출, 화장, 수업 방해, 폭력.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 ‘익숙’ 했던 학급 구성원일 텐데, 1년의 ‘방심’은 다시금 내게 무력감을 던져 주었다. 아이들이 미웠다. 미워하지 않으려 할 때면, 무력한 내 모습이 보였다.
어느 틈엔가 형식적인 조회와 종례, 인사가 오고 갔다. 아이들을 직접 보는 것이 ‘두려워’, 반장과 부반장을 통해 전달사항을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순회하듯, 교무실로 찾아와 아이들 수업 태도를 지적했다.
억울했다. 교과 시간에 일어난 일은 교과 담당 교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던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좌절감 속에, 교사와 학생 또 교사와 교사간의 소통 부재가 커져갔고 나는 고립되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크를 잡았다. 당시 취미 생활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팟캐스트(스마트폰 인터넷 방송)를 진행하고 있었다. 단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이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두려워’ 반장과 부반장을 통해 소통하려 했다면, 이 마이크를 통해 ‘간접’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실험이었다. 벼랑 끝에서. 이대로 학급이 무너지고, 이대로 교직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했다. 마이크 앞에선 아이들은 어떤 마법이 시작되는지,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알고 싶었던 것 그 이상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의 말을 차분하게, 유쾌하게 듣고 있었다. 마법이 시작되었다. 궁금해졌다. 이 아이는 무슨 일을 겪었을까. 어떤 고민이 있을까. 묻고 대답하고, 대답하고 묻기 시작했다. 알고 싶어 하는 마음과 알려 주고 싶은 마음.
듣는 자와 말하는 자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이번엔 아이들이 교사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할 일에 대해 아이들이 들어 주었다.
소통은 그렇게 다시 시작했다. 교육이란 결국, 필요로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 필요를 전해주는 것일 텐데, 그 고단한 여정을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통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았다. 나는, 얼마나 이 아이들의 말을, 마음을 들으려 했었던가.
마이크와 팟캐스트는 그저 소통의 도구일 뿐이다. 도구만으로 많은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지 않음이 분명하다. 표면적인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아이들의 생활태도는 우리네 기준에서 떨어져 있는 듯하다.
교육이란 삶을 변화시키는 긴 여정이고, 삶이란 한 번에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통로들 중 하나를 찾았다는 것, 이제 다시 ‘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찌 기쁘지 않을까.
이곳은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닌, 삶을 이야기하는 학교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