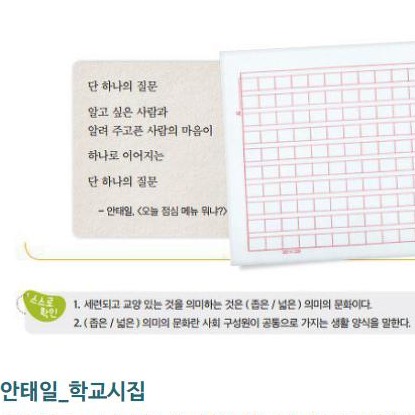<인권의 노래 (원작 '칼의 노래', 김훈)>
#패러디문학관
버려진 꽁초마다 꽃이 피었다. 담배 피는 1단지에 점심 식후에 비치어, 구름처럼 부풀어 오른 담배 연기들은 학교에 결박된 사슬을 풀고 어둡기만한 1단지 주차장 너머로 흘러가는 듯 싶었다.
담으로 건너간 학생들이 머무는 주차장으로 순찰 갈 때, 전자 담배에 뿜은 연기는 수증기처럼 몰려가서 소멸했다. 점심이면 먼 단지까지 학생들이 피러가고, 점심에 떠오르는 연기가 먼 주차장부터 다시 1단지까지 흘러나가는 것이어서 학교에서는 늘 민원이 먼저 오고 선도는 더디기만 했다.
건물뒤 해가 마지막 노을에 반짝이던 시시티비 위치 알게되면 학생은 캄캄하게 어둡고 숨겨진 그곳에 달려들어 책상 창고에 부딪히는 라이터 소리가 어둠 속에서 뒤채었다. 시선은 책상 창고 앞 탁구대에서 꺽여지고, 냄새로도 가늠할 수 없는 사각지대 너무 캄캄한 그곳에서부터 구름더미 같은 킥킥 소리와 담배연기로 무장한 학생들의 함성소리는 또 다시 날개를 펼치고 내게 일을 준다.
나는 학생의 일탈의 근거를 알 수 없었고, 학생 또한 내 열의의 떨림과 짜증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서로 알지 못하는 적의가 학교 가득히 팽팽했으나 지금 나에게는 적의만이 있고 교권이 없다.
나는 발령후 5년 초하룻날 경기도 그 지역에서 풀려났다. 내가 받은 고초의 내용은 무의미했다. 학교밖의 시선은 결국 아무것도 묻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허상을 쫓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허세가 가엾었다. 그들은 허상을 정밀하게 짜 맞추어 인권과 참교육이라는 그들만의 구조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현장의 현실에 입각해 있지 않았다. 현장에 묶여서 나는 허상들을 마주 대하고 있었다. 내 심장을 으깨는 허상들의 탁상행정은 뼈가 그스러지도록 아프고 화가났다.
나는 허상의 무내용함과 눈앞에 절벽에 몰아세우는 인권의 고통 사이에서 여러번 실성했다. 나는 학교를 옮긴 후 학교 밖 연수원 등을 돌아다녔다. 이름 난 교사들은 나를 걱정하는 피드를 날려왔다. 내가 70년대 폭력교사인듯 취급했으므로 그들에게 직접 내 상황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교사들은 다만 자신들의 자랑만 들려주고 돌아갔다. 이 세상에 일반화란 본래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분필로 콧구멍을 쑤시는 비염을 판치기에 교과서를 지져가며 낙을 느끼는 학생마냥 버티었다. 내 자격지심의 시작이었다.
00초 00중 00고에서 불어오는 참교사 바람에는 어쩌다 걸린 꽃동네 환경빨에 취한 그네들의 착각이 스며있었다. 눅눅한 담배의 향기를 품은 1단지 끝자락에서 교권 침해 하루이틀이냐 푸념이 피어 올랐고, 학생 인권에 밀려가는 바람에 고개를 포개면서 숨는 내 책임의식에 푸념했다. 초임 때 다짐은 끝이 다했거나 자격지심에 시체처럼 뒤덮여간다.
기만과 간보기가 우박으로 내리는 현장의 뒷전에서 저곳 탁상 행정가들은 오늘도 뭔가를 지령하고 운좋은 교사들은 자기 자랑에 빠진다. . 그것이 적응의 결과물이었다.
나는 보지못했으므로 모른다. 길건너 어느 학교에서는 이상위에 떠다니는 아름다운 아이들의 꿈의 날개를 부채질에 들어올려서 교사 사명을 노래할 수도 있겠다.
뒤를 돌아보면 뉴스에 나오는 학교에만 머무는 교사들도 있다. 무기력 속에 그 틀에 다시 던져졌다. 그 운좋음과 또 그 만큼의 추진으로 그들은 행복했고, 그렇게 하루를 또 산다.
푸념이야 어찌하던 간에 하루 또 살아야 하는 자는 살아서 그 자신의 교직을 끝내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끝없는 불균형은 결국은 무의미한 푸념이며 이 세계도 마침내 무성의한 곳인가, 내 판서 깊은 곳에서, 아마도 내가 알 수 없는 질투심의 심연에서, 그저 징징징, 그저 징징징 그렇게 징징징 거리기만 하듯,
인권이 울어대는 울음이 들니는 듯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