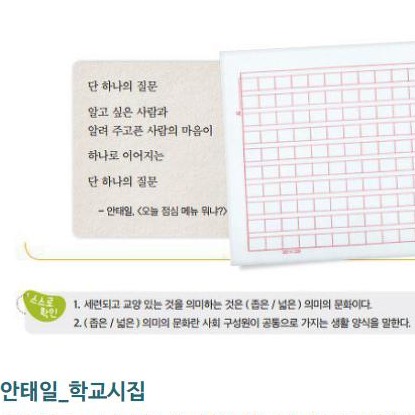<나의 수시 (원작 '나의 소원', 김구) >
#패러디문학관
네 꿈이 무엇이냐 하고 입학 사정관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꿈은 융합인재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바램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귀 대학의 명성이오.”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학습 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는,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계획은 귀 대학이 자랑하는 인재로 성장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교사 여러분!
나 수시생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다. 내 과거의 열아홉 평생을 이 원서를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원서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자소설을 달(達)하려고 살 것이다.
수상실적이 없는 학생으로 열아홉 평생에 설움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기 주도적인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아왔노라고 쓰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작년 옆담 담임 교사의 추천서 받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일단 어떻게든 합격만 되면 나는 그 대학의 가장 입결이 낮은 과에 들어가도 좋다는 뜻이다.
왜 그런고 하면, 요기 대학의 빈천(貧賤)이 저 먼 대학에서 받는 4년 장학금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옛날, 교무실에 갔던 반장이 “내 차라리 강남 재수학원의 재수생, 삼수생이 될지언정 없는 소설 지어내 수시로 합격을 누리지 않겠다.” 한 것이 그의 정신 나감이었던 것을 나는 안다.
반장은 정시는 높은 점수와 적은 원서만 쓴다는 것을 알아채고 달게 추천서 구걸 다니기 시작하였으니, 그것은 “차라리 내 구라쟁이 수시생이 되리라.”함이었다.
근래에 우리 교실 중에는 자기 동아리를 어느 큰 전문기관 산하기관에 필적하는 것처럼 구라치며 면접준비하는 자가 있다 하니, 나는 그 말을 차마 잘했구려 하거니와, 만일 진실로 그 동아리에 빈자리가 있다 하면, 나는 한달 굶은 미친놈인 듯 삐댈 수 밖에 볼 길이 없다.
나는 각종 대회, 수업, 스터디 활동, 체험활동을 통해 학습경험을 배웠고, 그들을 소감문에 기록하거니와, 그 경험들이 합하여서 세운 융합 인재성, 진로 계획을 품었다.
그것이 내가 그러려고 했던건 아닐진대도 자기소개서를 그 방향으로 끌고 들어가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런고 하면, 교과와 학종과 정시를 같이하는 수험생이란 완연히 없는 것이어서, 내 활동이 남의 활동이 쉽게 됨과 같이
이 구라가 저 구라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마치 복제인간이 여러 집에서 살기 쉬움과 같은 것이다.
학과를 두 개 이상이 나뉘어서 쓰게 되자면 하나는 리더십이고 하나는 봉사여서, 하나는 리더쉽전형이라 패기 넘치고, 하나는 봉사활동 전형이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쯤은 문제도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소위 수시 축소 주장의 무리는 깜깜이 전형의 수시를 부인(否認)하고 소위 수능의 공정성을 운운(云云)하며, 로또의 수시를 무시하고 소위 정시의 확대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금수저 계급 전형을 주장하여,
수시 전형라면 마치 이미 참교육에서 떨어진 생각인 것같이 말하고 있다. 심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대학도 변하고, 입시, 사교육 기형적 확산도 일시적이거니와 수시의 로또성은 영구적이다.
일찍이 어느 입시제도내에서나 혹은 특차로 혹은 논술로 혹은 대학별 본고사 등의 이해 충돌로 하여 수시파, 정시파로 갈려서 피로써 싸우지 않는 때가 없거니와
재내놓고 보면 수시란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외다.
고삼 교실은 필경 입시 철 아래 초목 모양으로 엎드린 자와 노트북 들고 다는 자가 이루어 살고 있다.
오느날 소위 수시확대 vs 정시 확대 논란이란 결국 영원한 입시 지옥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항시적인 입씨름이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니 오랜만에 죄송하옵니다만
교사 추천서 좀 써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