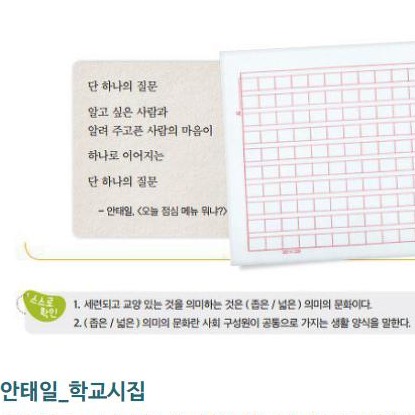<발암의 노래를 들어라 - 1>
"완벽한 교사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한 철밥통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교생 때 우연히 알게 된 어떤 교사는 내게 그렇게 말했다. 내가 그 참 뜻을 이해하게 된 것은 임용 후 한참 지난 뒤였지만
교직 생활하면서도 최소한 그 말을 일종의 방어기제로 받아들일 수는 있었다.
완전한 교사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그러나 그래도 역시 현장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절망적인 사안에 사로잡히게 됐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더 나은 삶에 대해서는 훈화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 보았느냐에 대해서는 아무 잔소리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옹알이다.
12년 동안 나는 계속 그런 자격지심에 빠져 있었다. 12년 동안. 긴 세월이다.
물론 모든 것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치려는 자세를 계속 지키려고 했었다면 경력을 쌓으며 무뎌져 간다는게 그다지 큰 고통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아마 보통의 교사라면 그럴 것이다.
1정 연수가 좀 지났을 때부터 나는 줄곧 다른 학교 교사와 나를 비교하며 살았다. 그 때문에 편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로부터 여러번 배아픈 질투를 느꼈고, 미워했고, 오해했고, 또 동시에 많은 이상한 푸념도 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왜 그리도 삐졌냐고 말을 걸었고, 마치 다리를 잘라내는 것처럼 소리 없이 관계를 끊고 거리를 두고 두번 다시 보려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 몇번의 반복 끝에 페이스북을 닫고, 학교에서 입다물고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자세로 10년을 맞았다.
이제 나는 내 푸념을 늘어 놓으려 한다.
물론 문제는 이 푸념이 더 큰 문제를 묶어 만들 수 있으며, 푸념을 덜어낸 시점에서도 어쩌면 자격지심은 똑같다고 시인해야 할런지도 모른다. 결국 교사로서 하루 하루 살아간다는 건
자아 실현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 방어에 대한 쪼잔한 방어기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직하게 내 교직 경험에 대해 늘어놓는다는 건 여간 부끄럽고 오그라드는 일이 아니다. 내가 솔직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피맺힌 언어는 더 오해와 푸념 속으로 가라앉아 버린다.
해명할 생각은 없다. 적어도 여기서 내가 늘어놓으려는 것은 현 시점의 나로서는 나름의 최선을 다한 것이다. 남탓할 것도 없고 내탓할 것도 없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도 이곳에서 살고 있다.
운만 좋으면 먼 훗날에 이과 담임이 되거나 지역 명문고 문과 담임이 되거나 특목고에 있거나 어쩌면 매우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학교에서 헤벌레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더 나은 삶을 살았냐고 물을 때 더욱 나 자신이 힘들었다고 포장하며 지금은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 정상화 되었다고 예기하기 시작할 지 모른다.
나는 교직에 대한 많은 걸 k에게서 배웠다. 거의 전부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k 교사 자신은 모든 의미에서 꼰대스런 교사였다. 그의 페북과 그의 썰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
학교는 평화롭고, 교칙은 엄했고, 학생들은 열의가 있었고, 그는 먼 곳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의 교육적 철학을 담보로 현장에 임했던 것은 ,
그 양반은 내가 인정하는 몇 안되는 현장 교사였기 때문이다.
00, ㅁㅁㅁ, ###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른바 유명한 교사들의 그럴싸한 나 잘났어요 하는 대열에 끼여도 k의 그 꼰대스러운 교직 마인드도 결코 뒤지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k 자신은 지금까지 자기가 꼰대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못했다. 결국 꼰대라는 것은 그런 뜻이다.
그가 자유로운 교사였던 건 6년과 2개월, k는 결국 고삼 담임을 맡아야 했고, 그리고 사라졌다. 2017년 3월의 어느 바쁜 봄날의 개학식날, 그는 오른손에는 수박씨 먹고 대학가자를 끌어안고 왼손에는 한수산의 소설을 펴들고 동해바다 언저리 깊은 바다로 필리핀 보홀의 바다로 다이빙했던 날만 추억하며 살았다.
그가 살아 있다고 느끼는 공간은 마찬가지로 교사로서 죽었다는 공간이었다.
(원작 :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무라카미 하루키)
( 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