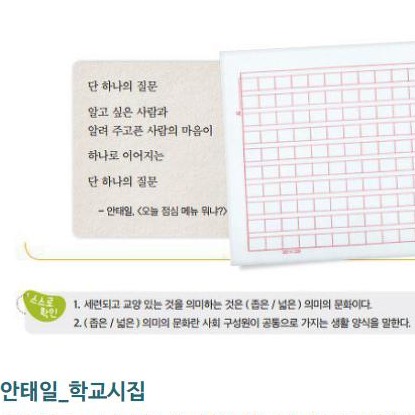<마지막 날>
"겨울 방학 아무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컵라면 익을 시간이 흘렀다. 교장 선생님은 마지막 훈화를 드디어 정리했다. 마지막을 기념하고 싶었다. 교가를 함께 부르려 했었다. 교가 제창은 없었다. 교무부장 선생님이 깜빡하신 걸까. 마지막 날에 가방 따위를 가져온 예비 고3들은 없었다. 실내화도 없었다. 책상 속도 비었다. 사물함도 비었다. 교실에 남은 사람들 흔적까지 깔끔하게 비우고픈 의지들만 가득했다.
담임 교사는 해탈 실천인들의 의지를 꺾었다.
힘주어 칠판에 글자를 채웠다.
- 츤츤츤 -
"이게 지난 1년 동안 내 컨셉이었다."
마지막을 채우고픈 담임 교사의 의지에 아이들은 다리를 책상 안으로 다시 밀어 넣었다.
"학생을 사랑하지 않겠다 노력했던 1년이었어. 교사와 학생 사이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의 사랑은 사명으로 하는 게아니거든요. 사랑은 하다 보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는 거죠. 억지로 사랑하겠다. 의지를 갖는 건 그거 좀 잔인하지 않아요? "
해마다 새 학급을 맡을 때마다 사랑을 다짐했었다. 더 많이 사랑하겠다. 더 많이 소통하겠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소통하면 더 열심히 교사 생활하는 거라 믿었다. 팟캐스트로 소통하는 교사, 아이들도 모르는 아이들의 마음을 아는 교사. 타이틀 등에 업고 여기저기 소통 강사로 보따리 장사도 했었다.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간증했었다.
사랑할수록 상처만 커졌다.
사랑하려 할수록 미움만 커졌다.
사랑을 성공하려 할수록 교실은 실패했다.
종업식은 이별 날이 아니었다. 군대 전역일이었다. 슬픔보다 개운함이 더 컸다. 그리움보다 아쉬움이 더 컸다.
상처도 싫었다. 미움도 싫었다. 교실 실패도 싫었다.
작년 봄이 오기 전 늦겨울에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답을 찾았다. 대한민국 교육의 최종 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이었다.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사회도 과학도 실과도 외국어도 체육도 모든 교과의 최종 목표는 같았다. 사랑이 아니다. 교사는 연애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교사는 '정치'하는 사람이었다.
"학교 왜 다닌다고 했지?"
담임 교사는 1년 동안 세뇌하듯 반복했던 질문을 마지막으로 다시 던졌다. 몇몇은 해탈한 듯 대답했다. 몇몇은 마지막을 예감했다. 몇몇은 웃었고 그 몇몇은 표정을 감추었다. 아이들은 저마다 감정에 따라 다른 톤으로 함께 대답했다.
"민주시민 되는 거요."
담임 교사가 다시 물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두 번째 이유는? 풋"
1주일에 5번씩 매주 반복해서 던진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었다. 생각이 여러 겹 겹쳐 그만 웃고 말았다.
"ㅋㅋㅋㅋ 정당한 경제인 되는 거요 "
아이들도 함께 피식했다.
"그렇지. 그거 잊지마.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 더 길게 설명 안 해도알 거야. 니네들이 당신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거든. 나라 주인이 제대로 민주주의도 모르고 민주시민답게 크지 못한다? 그거 나라 망하는 거야. 이제 곧 스무 살이야. 어른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경제 활동은 숭고한 거야. 단 정당하게 하라고 했지. 그 두 가지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 정당한 경제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고 교사가 할 일이고 담임 교사가 더 챙길 일인 거지. "
집에 일찍 가는 것을 내려놓은 듯했다. 마지막을 눈치챈 몇몇이 마지막 경청을 끌어주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맡아야 할 포지션이 무엇이었을까 고민 많이 했었다. 1년 동안 네놈들이 저지른 일들 돌아봐. 그치? 청진기 갖다 대니까 견적 나오잖아. 어쩔 수 없었다. 십여 년 학교생활이라면서 제일 행복했던 1년이었다. 사고를 쳐도 귀엽게 쳐주고. 하자면 안 했지만 하지 말자면 하지 않았다고 연기하는 것이 너무 이뻤으니까. 그런데 어쩌냐.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이뻐하는 마음 1밀리만 보여 주어도……. 알지? 무슨 무슨 일 생겼는지. 암튼 그랬다. "
손목시계를 슬쩍 보았다. 복도 창문 너머 옆 반 아이들이 상록수 마지막 장면처럼 모여있었다.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내 포지션은 츤츤츤(츤데레)였다. 니네가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진 않았어. 아쉬운 건 나였으니까. 실은 너그들 많이 좋아했었다. 다시 말하지만,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는 건 나중 문제야. 교사가 사랑해야 하는 건, 당신들을 민주시민으로 기르고, 정당한 경제인으로 길러서 이 나라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게 만든다는, 내 직업을 사랑하는 것이 맞거든."
사랑? 그거 다 구라다."
타짜 대사를 빌렸다. 아이들 마지막으로 크게 웃었다.
"새 학년, 마지막 십대, 곧 스무살이다. 그 두 가지 있지 말고, 그렇게 성장하길. 1년 동안 당신들 덕에 아주 힘들었다. 그런데 싫지는 않았다. 나는 행복했다. 저녁 6시 이전까지는 연락받는다. 가자. 반장? 인사."
등을 돌려 '츤츤츤'을 지웠다. 다시 등을 돌렸다. 교실이 급히도 비어졌다. 마지막을 알아챈 몇몇이 교탁 앞으로 모였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m고에서 보낸 마지막 하루였다. 1년 동안 끌고 온 츤츤츤 포지션을 내려놓았다. 감정은 이제서야 자리에 찾아왔다. 전역일이 아니었다. 이별 날이었다. 교무실 책상과 사물함을 가득 담은 상자들을 차에다 실었다. 스피커와 마이크. 교재와 분필꽂이. 책꽂이와 간이 서랍. 마우스 패드와 도장들.
교무실 흔적도 비웠다.
안녕. m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