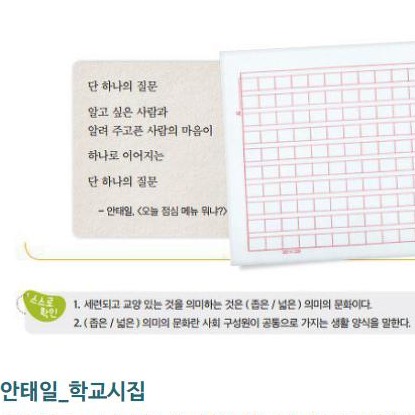체계적인 '질병 활동'이 나에게 하루를 선물해주었다.
이번 주는 퇴근 시간이 다른 때에 비해 늦을 예정이었다. 학생부에서 선도 처분을 맡은 아이들을 학년부 생활 지도 담당 교사가 지도해야 했다. 난 그 지도 교사였다.
교내봉사 대상 아이들은 총 세 명이었다.아이들 숫자는 적었지만 그래도 부담은 부담이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직접 관찰하지도 못한 데다가 수업을 들어가지 않은 반 아이들이라 관계 형성도 제로 상태였다. 낯선 아이에게 벌을 준다는 건 언제나 부담이다.
그래도 초임 교사 시절, 혼자서 80여명의 아이들을 한번에 지도해야 했던 부조리에 비하면 코스트코 호주산 대용량 '꿀'이라 생각하기로 했다.
어제 세 명의 아이들에게 전화를 모두 돌렸다. 문자도 친절하게 시베리아 대륙 횡단 철도 길이 부럽지 않게 길게 보내주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게 되어 이번 주는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다음 주로 미뤄두었다.
7교시가 끝나갈 때쯤 아이들 담임 선생님들을 한 분씩 찾아갔다.
"A는 오늘 교내봉사인 거 알고 있죠?"
A의 담임 선생님이 코로 긴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오늘...아프다고 학교 안 왔네요..."
어. 라. 고개를 돌려 B의 담임 선생님께 물었다.
"B는오늘 저한테 와야 하는 거 알고 있죠?"
B의 담임 선생님은 고개를 잠시 숙였다 들면서 답했다.
"하아...오늘 질병 결석이라네요. "
B의 담임 선생님은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거 보아하니, 리듬 탔다. 슬픈 예감을 가슴에 묻으며 C 교사에게 물었다.
"C도 설마 아픈가요?"
C의 담임 교사는 잠시 천장을 쳐다보고 옅은 한숨과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하아…. 그렇다네요..."
왕년의 해병대 출신 교사의 악명에서 벗어나 친인권적인 교내봉사를 계획했었다. 천사들의 합창 히메나 선생님처럼 사랑과 열정으로 지도하려 했거늘, 나의 다짐은 첫날부터 그렇게 우르르 무너졌다.
"아니, 이분들 거 왜 갑자기 단체로 아프실까요. "
허무한 발걸음을 질질 끌고 자리로 돌아가 노트북 전원을 끄고 가방을 주섬주섬 쌌다. 화는 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의 체계적인 조직적 '질병 활동'에 헛웃음이 나왔다. 옆자리 선생님이 어깨를 툭치며 말했다.
"선생님. 그래도 낫지. 한 명은 나오고 두 명 안 나오고 그랬어 봐."
그렇다. 맞다. 이들이 누구인가. 학교 수업을 잘 듣질 않아 나한테까지 오게된 친구들 아닌가. 수업조차 자기 주도적으로 듣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교내봉사 참여 역시 그날의 온도와 컨디션과 지구 자전축과 핸드폰 배터리에 따라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친구들 아닌가.
그리고 진짜로 아팠을 가능성은 더 크지 않았는가. 이들은 각기 자신만의 날짜 개념으로 교내봉사 일정을 조절할 능력자들이다.
그리하면 한 명 나오고 두 명 안 나오고, 다시 다음 날에는 그 한 명 안 나고 다른 한 명 나오고 다른 한 명은 또 안 나오고.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 참석하게되면, 5일만에 끝낼 교내봉사를 열 하루 동안 진행했어야 할 운명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분들을 보라. 얼마나 교사 친화적 학생들이란 말인가. 한꺼번에 나오지 않으니 한꺼번에 날짜를 연장하면 될 일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헛웃음을 내쉴 것이 아니라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흐르는 감격의 눈물을 닦아야 옳지 않았을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분들은 합심하여 내게 하루를 선물해준 것 아닌가.
퇴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오늘 하루 또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행복하기로 했다. 정신 건강이 한결 상쾌졌다.
오늘도 무사히.
올해는 이렇게 제발 끝까지 무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