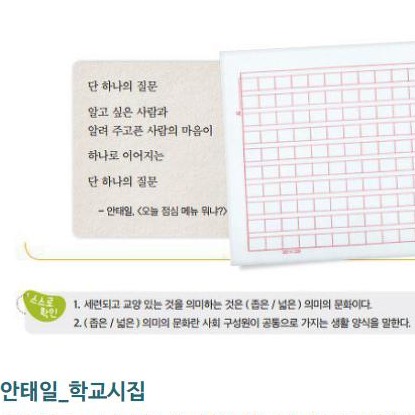원문 http://www.sciencetimes.co.kr/article.do?todo=view&atidx=0000063789
|
교육현장의 목소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방송을 진행할 텐데.. 반장 아이스크림을 왜 먹게 됐지? 체육대회 시간에 아이스크림을 사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때 못 먹어서 이번에 저희가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사게 됐어요. 우리 부반장 친구, 체육대회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좋은 성과는 못 이뤘는데 좋은 추억을 남겼어요. 그래 그럼 우리 학급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야기 해볼까? 우선 밝은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게. 우리 반 루머에 대해서 정리해 봐야겠어. 희주랑 지영이 일루 와보세요." <‘안태일샘의 감성통신문’(1318 토크 콘서트) 중 >
소통으로 이뤄지는 공교육 실험 방송의 주인공은 ‘공교육 에듀테이너’라고 불리우는 안태일 교사(32)다. 사회·정치·경제를 담당하고 있다. 안 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학생들과 함께 해온 ‘1318 토크 콘서트’ 이외에도 어려운 과목을 재미있게 강의하는 ‘레알보충’, 교사들의 고민을 나누는 ‘샘수다 방’과 ‘출제해서 생긴 일’(동영상) 등 모두 4개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인기 방송인이 된 안 교사는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팟캐스트로 맞춤형 강의도 하고, 아이들에게 추억도 만들어 주고 싶어 방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레알보충’의 경우 학습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송으로 진도를 따라 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고민하다 만들게 됐다. 학교폭력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처럼 방송을 통해 교실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안 교사는 "방송을 통해 다양한 소통이 가능하고,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 싸움이 서로 간의 오해에서 비롯되는데 이런 소통을 통해 그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것 같다"며 학교폭력 근절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다음은 안 교사와의 인터뷰 내용. ▶ 최초의 고교 팟캐스트 방송을 제작한 동기는? "작년에 학급이 여러 모로 문제가 많았다. 다른 선생님들도 우리 반에 수업을 들어오기 싫다고 하소연 하셨다. 어느 순간, 저도 아이들과 벽이 생겨 점점 멀어지게 됐다. 상처도 받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 '혹시 방송의 형식을 빌리면 소통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 ▶ 기억에 남는 방송은? "흡연자 특집 방송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누적된 흡연으로 교내봉사와 사회봉사를 다녀온 친구들과 면담 방송을 했는데, 저도 화가 많이 누그러지고 아이들도 솔직한 자세로 방송에 임해 나중에는 너무 적나라한 내용까지 아이들이 술술 다 이야기해서 제가 당황할 정도였다. 물론 모든 상담을 방송으로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방송의 형식이 아이들과의 소통에 큰 도움을 준 것이 기억에 남는다." ▶ 방송을 하면서 아이들이 달라진 점을 느꼈나? 느꼈다면 어떤 점을? "어려운 이야기지만 방송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다. 사실, 아이들이 달라졌다기 보다는 저의 마음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됐다. 평소에는 얼굴을 바라보는 것도 힘들었던 아이들, 제 마음 속에 교사로써는 가져서는 안 되는 미운 마음들이 방송을 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는 걸 느끼게 됐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담임선생님이 우리에게 관심과 그 '무엇'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방송을 통해 구현하고 싶은 점은? "사실 제가 꿈꿨던 것은 42명의 과밀학급의 현실 속에서 끼리끼리 어울리다 보니, 같은 반 아이의 이름도 잘 모르는 이 차가운 교실 공간에서 방송을 통해 소통하며 단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0~20년 뒤에도 추억으로 다시 공유하는 것, 그러한 소통의 문화를 만들고 싶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이들이 좀 더 따라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나의 숙제라고 생각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