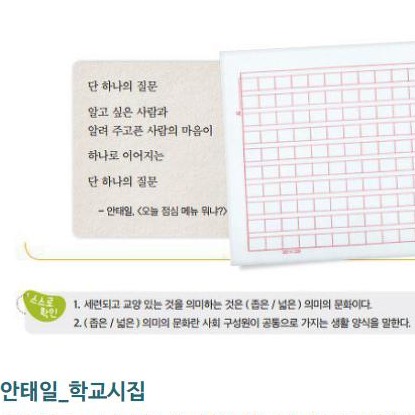<무'좋아유'> 원작_무소유_법정스님글 패러디문학관
"나는 선량한 범생이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교과서와 교실에서 쓰던 볼펜과 폰 한대, 허름한 교복 한벌, 체육복,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생기부, 이것뿐이오"
어떤 학생이 흡연 의혹으로 학생부에서 담당 교사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이다. 이 담배는 친구의 담배이지만 죽어도 친구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아이의 어록을 듣다가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 내 분수에는.
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처음 가입할 때 나는 팔로우도, 페친도 없었다.
오프라인에서 살만큼 살다가 이 가상의 공간에서조차도 사라져갈 때에도 빈 손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SNS를 하다 보니 이것저것 내 몫이 생겼다. 물론 일상에 소용할 수 있는 피드백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꼭 긴요한 것들만일까? 살펴볼수록 없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SNS를 시작하게 되지만, 때로는 그 SNS 때문에 적쟎이 마음 쓴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좋아요, 알튀, 팔로우, 댓글, 공유를 갖게 된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얾메인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SNS가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페친, 팔로워를 많이 가졌다는 것이 흔히 자랑거리지만, 그만큼 많이 얽히어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살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지난 해 봄까지 이름 있는 SNS 서너개를 정성스레 정말 정성을 다해 관리했다. 몇 년 전 거처를 싸이월드에서 도토리에 흠뻑 젖어 있을 때, 한 지인이 트위터를 소개시켜 주고, 다시 페이스북으로 인도하고 다시 인스타그램으로 인도하고 다시 티스토리로 인도해 주면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오프라인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나에게 친구들은 SNS뿐이었다. SNS 관리를 위해 여기 저기서 재밌는 글들을 긁어다 공유했고, SNS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처묵 처묵 이런 저런 음식들을 씹어 먹고 인증샷을 올렸다.
번역기를 써가며 외국 SNS 영상이나 글을 긁어 오거나 있지도 않은 일을 부풀려 썰을 풀곤 했다. 여름철이면 살 빛 사진, 겨울에는 필요 이상으로 따싸쓰시름한 사진으로 SNS 온도를 높이곤 해었다.
이런 정성을 일찍이 학생에게 바쳤다면, 아마 참교사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듯 애지중지 관리한 보람으로 이른 봄이면 늘어나는 페친 수와 함께 공유 꽃을 피워 나를 설레게 했고, 알림 창에는 빨간 숫자가 청청했었다. 내 SNS를 찾은 사람마다 님아 인기짱 하며 좋아라 했다.
지난 봄 황사가 갠 어느 날 페친 모 교사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황사에 갇혔던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모 교사와 함께 씹어 먹던 음식에 윤기가 차르르륵 흘러 나왔다.
아차! 이 때에야 문득 생각 났다. 이 음식을 먹스타그램, 허세이스북, 트위터에 올리지 않았던 것이다. 좋아요와 알튀와, 님을 팔로우하기 시작했습니다가 눈에 아른거려 더 지체할 수 없었다. 허둥 지둥, 대화를 멈추고 인증샷을 찍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가장 활발한 좋아요 타임인 9시~ 11시를 놓쳐서 인증샷은 반응이 별로였다. 안타까워 안타까워하며 나 홀로 좋아요 누르고 지우고 좋아요 누르고 지우고를 반복했더니 그제서야 그럭 저럭 빨간 알림 창에 수가 늘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 버린 것 같았다.
나는 이 때 온 맘으로, 그리고 좌심방 우심실을 우찔러 가며 느꼈다. 중독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SNS에 너무 중독된 것이다. 이 중독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SNS을 관리하면서 그저 길을 걷가 우와 쩐다, 하고 느꼈던 감정마저 봉한채, 이건 남겨야돼, 이건 올려야돼, 반응 좋을거야, 하며 샷질에 꼼짝 못하는 날 보았다.
잠시 응가를 처리할 때도 샤워를 할 때도 알림이 울리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왼손에 폰, 오른손에 휴지나 샤워기를 쥐고 있었다. 그것은 덕후질도 아닌 그저 중독이었다.
며칠 후, 인기 아이돌 친구 수락 확인 메시지 마냥 반응 없는 친구가 놀러 왔기에, 선뜻 그 친구 앞에서 SNS를 비활성화하였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을 듯 홀가분한 해방감, 삼년 가까이 함께 지낸, 넷정을 떠나 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 때부터 나는 하루에 한 시간씩은 나를 위해 멍때리기를 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SNS의 무-좋아유를 통해 뭔가 아날로그하면서 인문학하면서 있어보이는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좋아유의 역사인 것 같다. 보다 많은 좋아유를 위해 끊임없이 공유하고, 자극적인 글을 올리고.
좋아유 욕구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한명이라도 더 공유하고 더 팔로잉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오프까지 좋아유 하려 든다.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날 좋아유 하지 않으면 끔찍한 좌절감도 불사하면서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비판하기까지 한다.
좋아유 욕구는 자존감과 비례한다. 그것은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제의, 절친들이 오늘에는 쌩까게 되는가 하면, 서로 헐 뜯던 사람끼리 폐쇄형 SNS에서 핡핡핡하기도 한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좋아유 역사에서 무 좋아유 역사로 그 뱡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모든 스타트업은 망할 것이다.
그러고 보니, 계정 비활성화하고 인간 관계가 더 나빠진 것을 이제야 기억해 냈다.
어쨌든, 담배가 자기 소유 아니라며, 그 친구와 자기는 그저 얼굴만 아는 사이일 뿐 서로 좋아유 사이가 아니라던 학생부 그 아이가 생각난다.
그 아이에게 또 이런 말도 했다.
"담배를 소유하기만 해도 징계에유... 담배를 안 좋해야지유...."
누군가 나의 모든 것을 좋아해 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 남에게 좋은 일들만 하는 세상이 된다면, 우리네 좋아유 문화는 더욱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오프라인 삶에도 영향을 주는 이 마당에, 어차피 좋아유 할거라면, 내가 먼저 좋아유를 해주고, 좋아유 할만한 일들로 가득찬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
알튀 숫자와 좋아요, 댓글, 공유 숫자에 집착않고 쿨하게 내가 먼저 좋아유 하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방금 만든 말인데, 그런 말이 아무튼 지금부터는 있다.
좋아유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일이다.
좋아유 따위에 연연 않고 서로 서로 먼저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세상을 갖는 다는 것이 바로
무 좋아유의 역리이니까.